문학 아카데미 시선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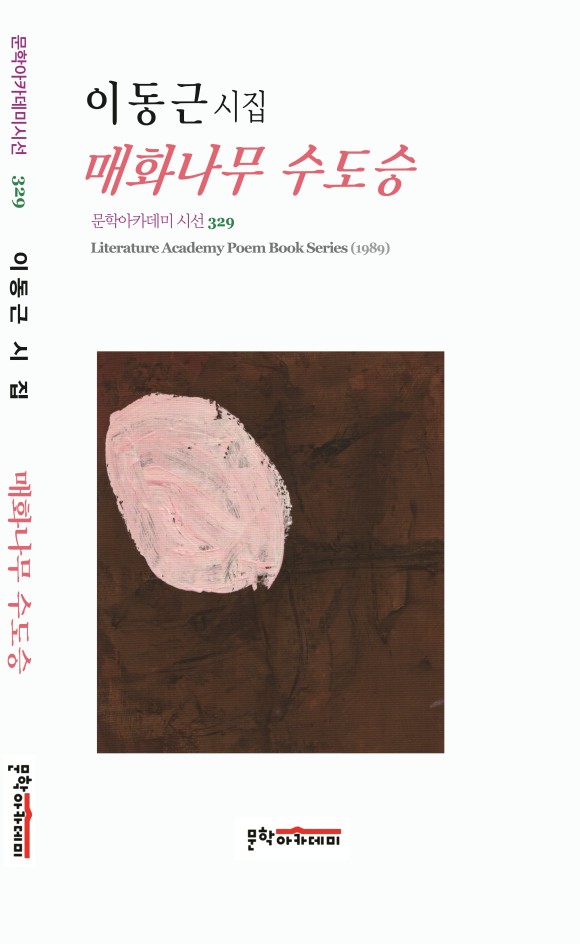
시인은 시 속에서 그 어떤 사람하고도 다른 나여야 하고, 첫 시집에는 감춰왔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나는 이런 시를 읽을 때 시를 쓰고 싶어진다.
지백수흑(智白守黑). 계곡
이동근
나무들이 한 섬씩 안개를 지고 내려온다.
어둠이 엷어지는 새벽 골짜기
깊은 골을 울리는
딱따구리 나무작대기 차는 가락,
나무들이 안개짐 내려놓고
실루엣으로 선다.
어둠이 지워지고
하얀 안개가 서 있다
새벽 안개는 여백,
나무의 실루엣은 먹선,
안개짐을 내려받은 계곡에
풀들이 파랗게 일어나고,
개울물이 흐른다.
부리지 못한 어둠을 등에 지고
막연한
나.
----------------------------
마음이 흩어져 갈피를 잡지 못하는 날은 시에서 읽은 어떤 실마리가 다가와, 오래 전 숨겨 놓은 아픔을 열어젖혀 주기도 한다.
사람들은 짐을 다 털어내고 깃털처럼 떠나갈 수 있을까. 시를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우리의 최후는 비애도 웃음도 아니라는 것쯤 알고 있다.
사람은 왜 지치고 피폐해지기도 하면서 부드럽고 둥글고, 귀퉁이가 허물어진 무한한 짐을 지고 살까.
하루를 마치고 오늘 할 일을 다 했는지 점검한다.
한 줌의 짐도 남김없이 버리고 싶어져, 오늘이 가는 것이 도리어 짐이 되기도 한다.
짐은 어둠에 가려져 불투명하고 다시 안개와 만나 당혹스럽다.
짐이 터져버려 격렬하게 황소울음 소리를 내게 될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짐을 부려야 산다. 나는 조금씩 짐을 줄이려고 골인 지점을 향해 경계 없이 이 길 저 길로 뛰어 왔다
이 시에서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환청은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 축 처진 몸으로 잠들며, 보이지도 않는 막강한 짐을 아무렇게나 바닥에 철퍼덕 내려놓을 수는 없다.
마지막 행에 닿았을 때 끝내 부릴 수 없는, 부리지 않아도 될 나의 짐이 떠올라 이 시의 전문을 읽고 또 읽었다.
이제 그날의 짐을 그날 내려놓기 위해 바둥거리며 살지 않아도 될까.
먹물의 단호함만을 따르지 말고 여백과 닿는 면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답게 좀 성글게 사는 것이 빽빽함보다 더 나을 것이다
짐은 긴장을 주고 긍지를 가지게 한다.
한 순간도 짐이 없던 순간을 기억하기 어렵다.
견딜 수 없는 순간에 복종하지 않고 생각이 차올라 일어선 것은 벅찬 짐을 스스로 품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동근 시인의 <지백수흑(智白守黑). 계곡>을 읽으며 그 곳으로 달려갔다. 어둠이 되었다가 하얀 안개로 서 있었다. 파랗게 풀이 되어 일어나, 개울물에 씻겨진 후, 침착해지고 단순해졌다. 내일부터 한층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동근 시인 첫 시집 <매화나무 수도승>은 간결하고 대담한 필치와 은유의 풍부함을 즐길 수 있는 시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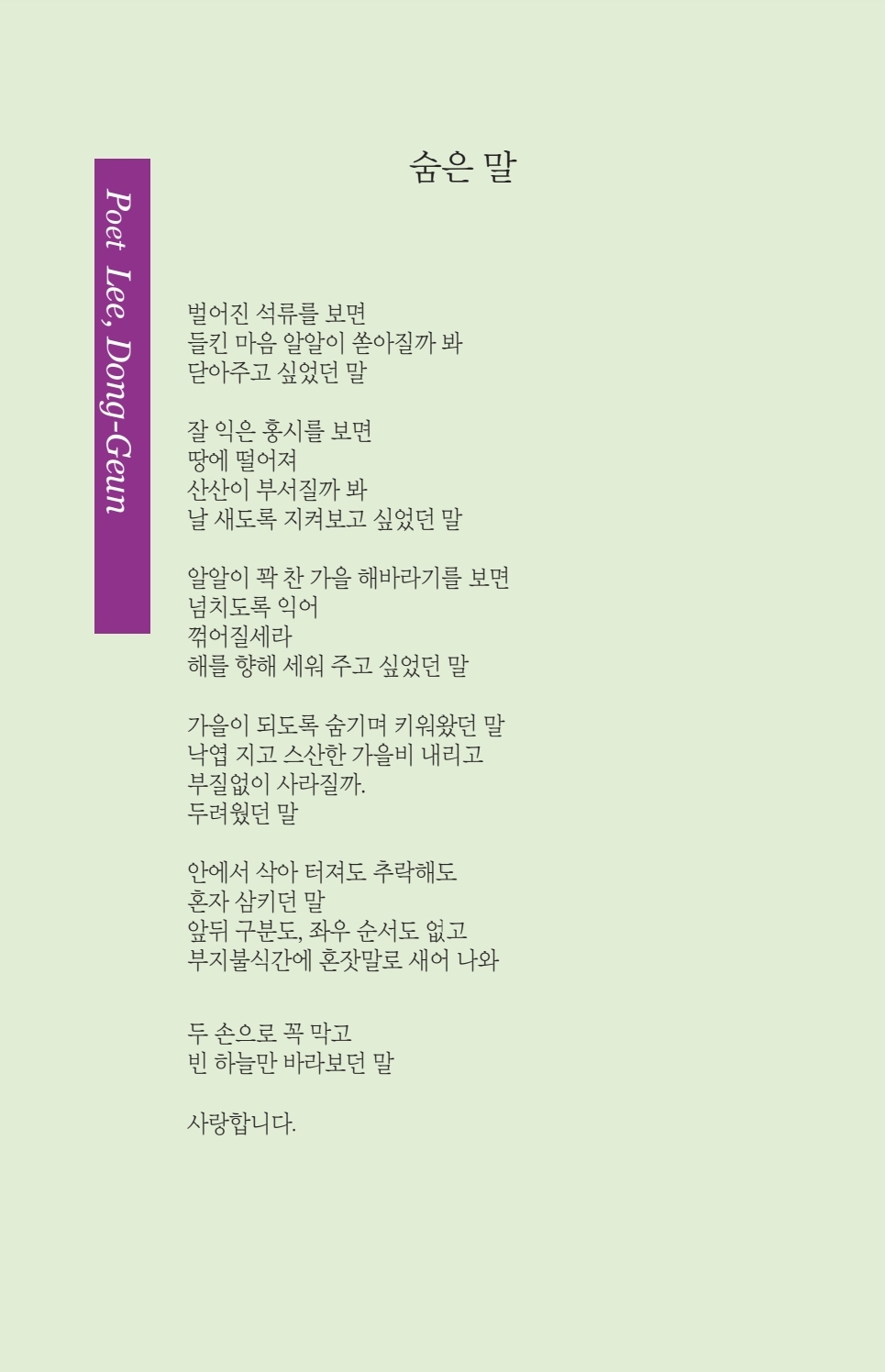
이동근 시인
▶프로필: 전북 부안 곰소 출생. 서강대 사학과 졸업. 2021년 『문학과 창작』등단
수상: 2021년도 『문학과 창작』 신인상.
시집:『매화나무 수도승』
▶연락처: 이메일: 1sekyung@hanmail.net


'LIFE STYLE > ART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 [동백 엄마] 김리영 시집 <푸른 목마 게스트하우스> (0) | 2024.12.06 |
|---|---|
| 신간 소개 <푸른 목마 게스트하우스> 김리영 시집 (18) | 2024.12.01 |
| 루이비통코리아 메종 여성작가 신디셔먼 전시회 (0) | 2023.11.06 |
| 죤버거맨 그림에 대한 해석과 다양한 작품들 감상 (1) | 2023.10.10 |
| 충주 가볼만한 곳 탑평리 칠층석탑, 제천 사사자 구층석탑, 미륵대원리 석조 귀부, 미륵리 삼층석탑, (0) | 2023.09.20 |



